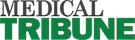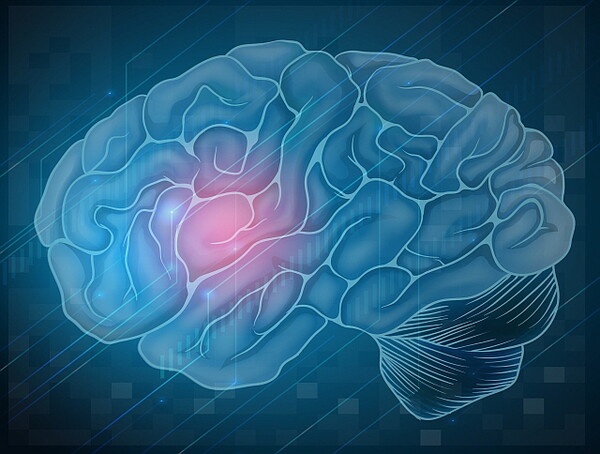
소아 악성뇌종양의 분류 체계를 바꾸면 질환 발생을 좀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 김승기·김주환 교수, 병리과 박성혜 교수 연구팀은 최신 WHO 분류 체계로 소아 악성 뇌종양을 재분류한 결과, 과거 교모세포종 등으로 진단됐던 사례의 절반 이상이 소아 고등급 교종(pediatric-type high-grade glioma, pHGG)에 해당됐다고 신경학 분야 국제학술지(Neuro-Oncology Advances)에 발표했다.
전체 소아암의 약 20%를 차지하는 소아 악성 뇌종양은 소아기 암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 가운데 소아 고등급 교종은 뇌의 신경교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재발이 잦으며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좋지 않은 난치성 질환이다.
국내 pHGG의 임상 및 분자유전학적 특성을 대규모로 분석한 이번 연구 대상자는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수술받고 교모세포종, 역형성 성상세포종, 원시신경외배엽종양 등으로 진단된 환아 78명(1997~2023년).
이들의 조직을 WHO 중추신경계 종양 분류 5판(WHO CNS5)에 따라 재분석한 결과, 41명(52.6%)이 새롭게 소아 고등급 교종(pHGG)으로 분류됐다.
세부 아형은 △H3 K27 변이 광범위 정중선 교종(DMG-H3K27) 11명 △H3 G34 변이 광범위 반구 교종(DHG-H3G34) 5명 △H3/IDH 야생형 소아 광범위 고등급 교종(DpHGG-H3wt/IDHwt) 15명 △영아형 대뇌반구 교종(IHG) 10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기존 성인 교모세포종 중심의 진단 체계가 소아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추가로 WHO 새 기준에 따라 신규 진단된 20명을 포함한 총 61명의 임상·유전체 정보를 분석했다. 유전체 분석이 가능했던 48명 중 34명(70.8%)에서 TP53 변이가 확인됐다.
특히 H3/IDH 야생형 아형에서는 환자의 절반(50%)에서 리프라우메니증후군, 신경섬유종증 1형(NF-1), 유전성 불일치복구결핍증후군(cMMRD) 등 암소인 증후군이 동반됐다.
분석 결과, 영아형 대뇌반구 교종(IHG)의 생존율은 다른 아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01). 2년 생존율은 92.3%, 5년 생존율은 73.8%였으며, 수술 전절제(GTR) 환자군이 비전절제(non-GTR) 환자군보다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01).
김승기 교수는 "과거 진단 기준으로는 질환별로 경과를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최신 WHO 기준을 적용하면 예측력이 향상된다"며 "영아형 교종은 장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 강도를 조절하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지원사업단의 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