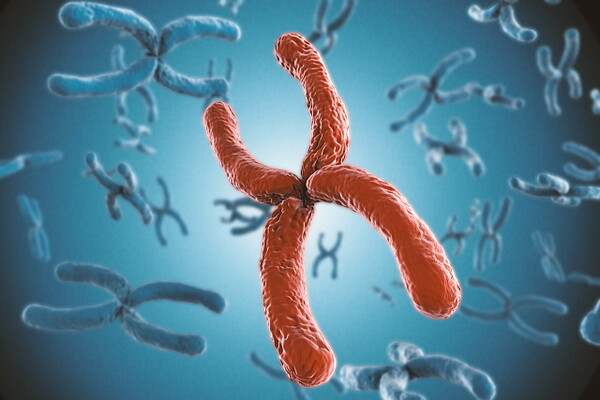
우울증이 심할수록 염증 관련 유전자가 많이 발현하는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우울증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함병주, 한규만 교수)과 건국대 연구팀(신찬영 교수), 한동대 연구팀(안태진 교수)은 우울증 환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염증 관련 유전자의 발현 수준이 높다고 정신의학 분야 국제학술지(Brain, Behavior and Immunity)에 발표했다.
염증은 생물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만성 염증 상태가 뇌에 기능 이상을 초래해 우울증 발생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팀은 우울증 발생시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동물에서 염증 조절 경로인 인터페론(Interferon) 관련 유전자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근거로 19세~64세 성인 우울증환자 350명과 정상인 161명의 특정 유전자 변화를 비교했다. 그 결과, 우울증 환자군은 대조군에 비해 염증 조절 관련 유전자의 DNA 메틸화(DNA methylation)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DNA 메틸화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고 조절하는데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우울증 환자에서는 염증 유전자의 DNA 메틸화의 변화로 염증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할 수 있다.
염증 유전자의 발현은 뇌를 비롯한 체내 염증 상태를 증가시킬 수 있고,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뇌의 전두엽 부위에 구조적 이상을 일으켜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는 우울증 환자군의 대뇌피질이 더 얇았으며, 염증 관련 유전자의 DNA메틸화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병주 교수는 "이번 연구로 염증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우울증 뿐만 아니라 뇌의 구조적 변화도 발생 가능성이 입증됐다"면서 "개인의 우울증 발병 취약성을 평가하는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규만 교수는 "유전자 검사로 우울증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을 조기 발견해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