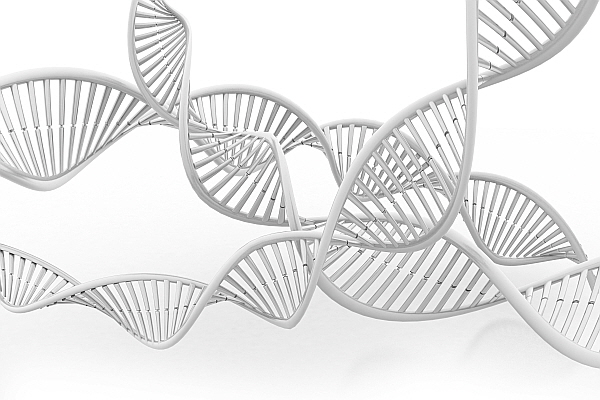
폐암이나 심장병 등의 질환 발병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하지만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캠브리지대학 가레스 홀랜즈(Gareth J. Hollands) 박사는 유전자검사와 행동변화를 검토한 연구를 계통적 및 메타 분석한 결과, 유전자검사 후 금연, 건강한 식사, 운동 등의 생활습관은 바뀌지 않았고 BMJ에 발표했다.
심질환과 대부분의 암, 당뇨병 등은 복합질환이라고 부른다. 단일 유전자 이상이 원인이 아니라 수십~수백개 유전자의 상호작용과 개인의 환경인자 및 행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기 때문이다.
최근 게놈배열 분석기술이 발달하면서 질환위험 유전자를 쉽게 검사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까지 검사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다.
반대측은 유전자변이가 반드시 질환을 일으키는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측은 검사해서 정보를 얻은 후 자신의 행동을 바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전자검사 서비스는 2000년대 초에 시작돼 캐나다와 영국, 유럽에서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미식품의약국(FDA)은 2013년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중지시켰으며, 최근에서야 일부 질환에 대한 유전자검사 판매를 허용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개인 DNA검사로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행동에 대해 지표로 평가한 연구를 Medline과 Embase에서 검색했다.
총 1만 515건의 연구를 검토해 최종 18건 7개 항목의 행동평가항목을 계통적 및 메타 분석했다.
행동변화 내용은 금연(6건, 2,663례), 식사내용 변경(7건 1,784례), 운동(6건, 1,704례), 금주(3건, 239례), 약물사용(1건, 162례), 자외선차단(1건, 73례), 검진과 행동변화 프로그램 참가(2건, 891례) 등이다.
모든 행동평가항목에 영향없어
메타분석에서 유전자검사군과 비검사군의 차이는 금연과 약물사용의 경우 오즈비가 각각 0.92, 1.26이고 식사, 운동, 금주, 자외선차단, 검진과 행동변화 프로그램 참가의 표준화 평균차(SMD)는 각각 0.12, -0.03, 0.07, 0.43, -0.04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고위험 유전자형을 가진 서브그룹의 분석, 그리고 행동변화 의지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의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유전자검사 결과를 들은 후에도 우울증상과 불안을 보이는 경우도 없었다.
의사가 검진 및 개입방법을 판단하는데 유용
홀랜즈 박사는 "대상 연구 대부분은 바이어스(편향)가 존재 가능성이 높거나 확실하지 않고, 증거의 질은 낮은 편"이라면서도 "유전자검사를 통해 질환 위험을 알려서 행동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지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 이번 연구결과는 위험억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복합질환에 대한 유전자검사와 고위험 유전자변이 검색을 반대하는 것이다.
반면 박사는 이러한 유전자검사 유용성에 대해 "임상의사가 고위험자를 발견하고 검진과 수술, 약물치료 등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